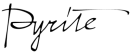창문들이 내 주위를 빙빙 돌며
휘파람을 분다
신사 숙녀 여러분, 밤이 돌아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이 밤의 병명은 무엇입니까
잠깐 자고 일어나 침대에 걸터앉아
길게 하품을 하는 나의 입속은 한겨울 비닐하우스처럼 후덥지근해
쫄쫄쫄 식도를 따라 내려가는 물에선 약냄새가 진동하는데
낡은 유니폼을 갈아입고 있는 밤이여, 오늘은
수용소 문학을 이해할 것 같은 날이기에
소각장의 연기가 무럭무럭 피어나는 것을 위로할 겨를이 없네
꿈을 꾸고 겁을 먹고 토사처럼 몸이 무너져 내려도
나는 영생을 믿지 않고
윤회 또한 내 차례까지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지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이웃들의 침대 위에서
믿음은 쉬지 않고 중얼거린다
누가 저 사람 입 좀 다물게 할 수 없어?
가래침처럼, 믿음은 왜 저렇게 끈적한 건지
내 쓰레기통에는 믿음이란 낱말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붉은 십자가의 전원을 내리고, 나의 머리맡에 자비를
그러나 나의 기도는 두 손 사이로 미끄러지는 비누처럼
거품이 잘 나지 않는다
양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누운 밤이여, 창문들이여
잠들었는가, 물끄러미라는 부사가 나를 수식해도
나는 나를 증명해 줄 만한 소속이 없네
창밖을 바라봐도 자꾸 내가 흐릿하게 나타나는 건
내 안의 암흑이 깊은 탓일까
새벽이 올 때쯤
이웃들은 하나 둘씩 일어나 기도를 시작하고
나는 색색의 크고 작은 알약들을 입에 또 털어 넣는다
연기가 흘러가는 쪽으로
비밀이 더 많아졌다
'FAV POEM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은규, 추운 바람을 신으로 모신 자들의 經典 (0) | 2016.10.24 |
|---|---|
| 독주회, 성동혁 (0) | 2016.10.24 |
| 나의 잠은 북쪽에서부터 내려온다, 김지녀 (0) | 2016.10.24 |
| 물체주머니의 밤, 김지녀 (0) | 2016.10.24 |
| 지엽적인 삶, 송승언 (0) | 2016.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