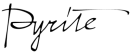보이는 것을 집어삼키기 위해
내 몸의 절반은 위가 되었다 가끔
헛배를 앓거나
묽어진 울음을 토해내지만
송곳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내벽의 주름들이
굶주린 항아리처럼 입을 벌리고 있다
안쪽으로 쑥, 손을 넣어 악수하고
손끝에 닿는 것들을 위무하고 싶은, 밤
나는 만질 때에만 잎이 돋는 나무조각이거나
따뜻해지는 금속에 가깝다
내 안에 꽉 들어찬 것은 희박하고 건조한 공기
기침을 할 때 튀어나오는 금속성 소리
날카롭게 찢어진 곳에서, 푸드득 날아간 새는 기침의 영혼인가
한 문장을 다 완성하기도 전에
소멸하는 빛과 어둠, 사이에서
나는 되새김질을 반복했다, 반복해도
소화되지 않는 두 입술
사물들의 턱뼈가 더욱 강해진다
밧줄처럼 허공에 매달린 나는 공복이다
'FAV POEM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알약들이 녹는다는 것, 김지녀 (0) | 2016.10.24 |
|---|---|
| 나의 잠은 북쪽에서부터 내려온다, 김지녀 (0) | 2016.10.24 |
| 지엽적인 삶, 송승언 (0) | 2016.10.24 |
| 시집, 김언 (0) | 2016.10.24 |
| 나의 고아원, 안미옥 (0) | 2016.10.24 |